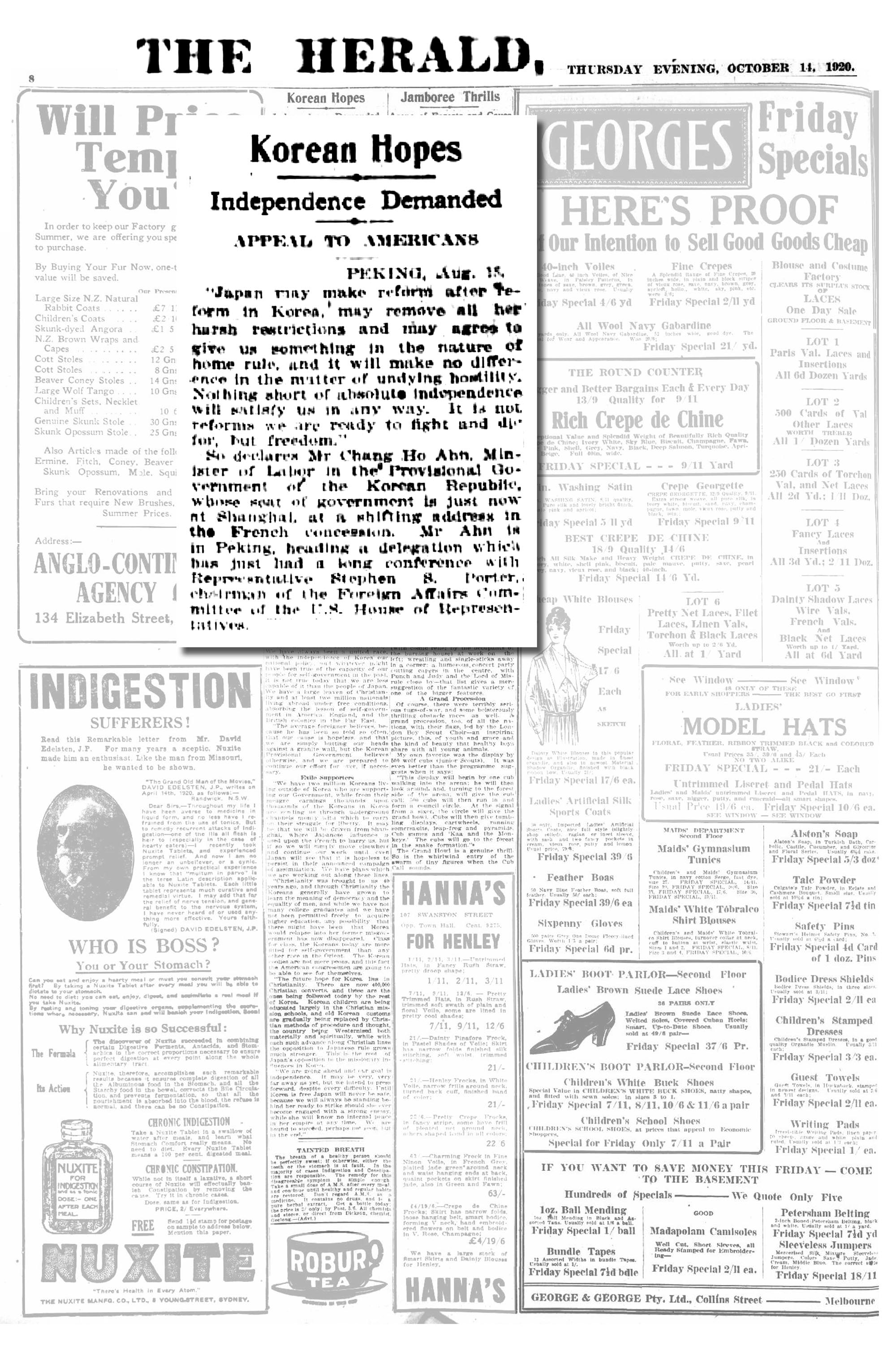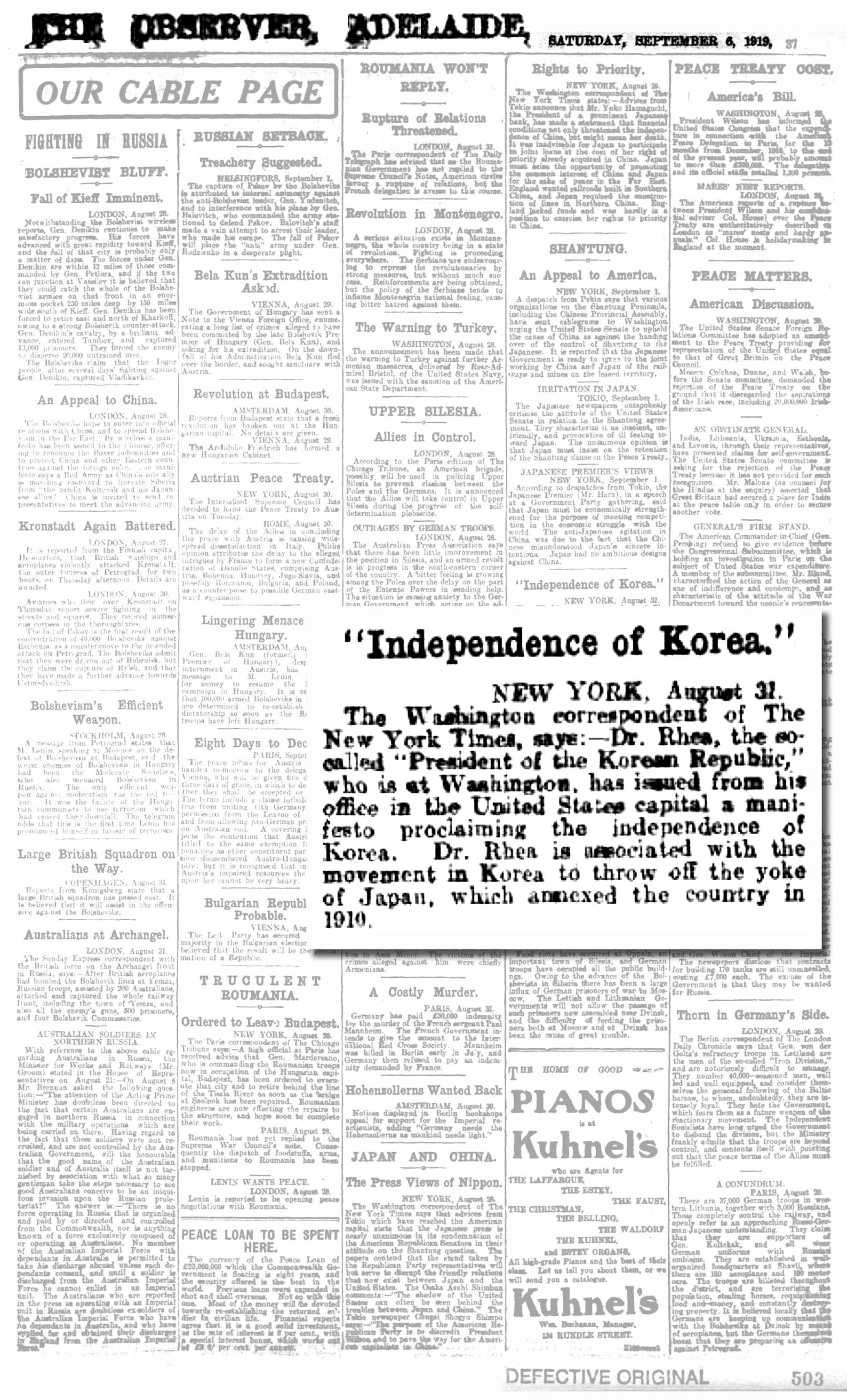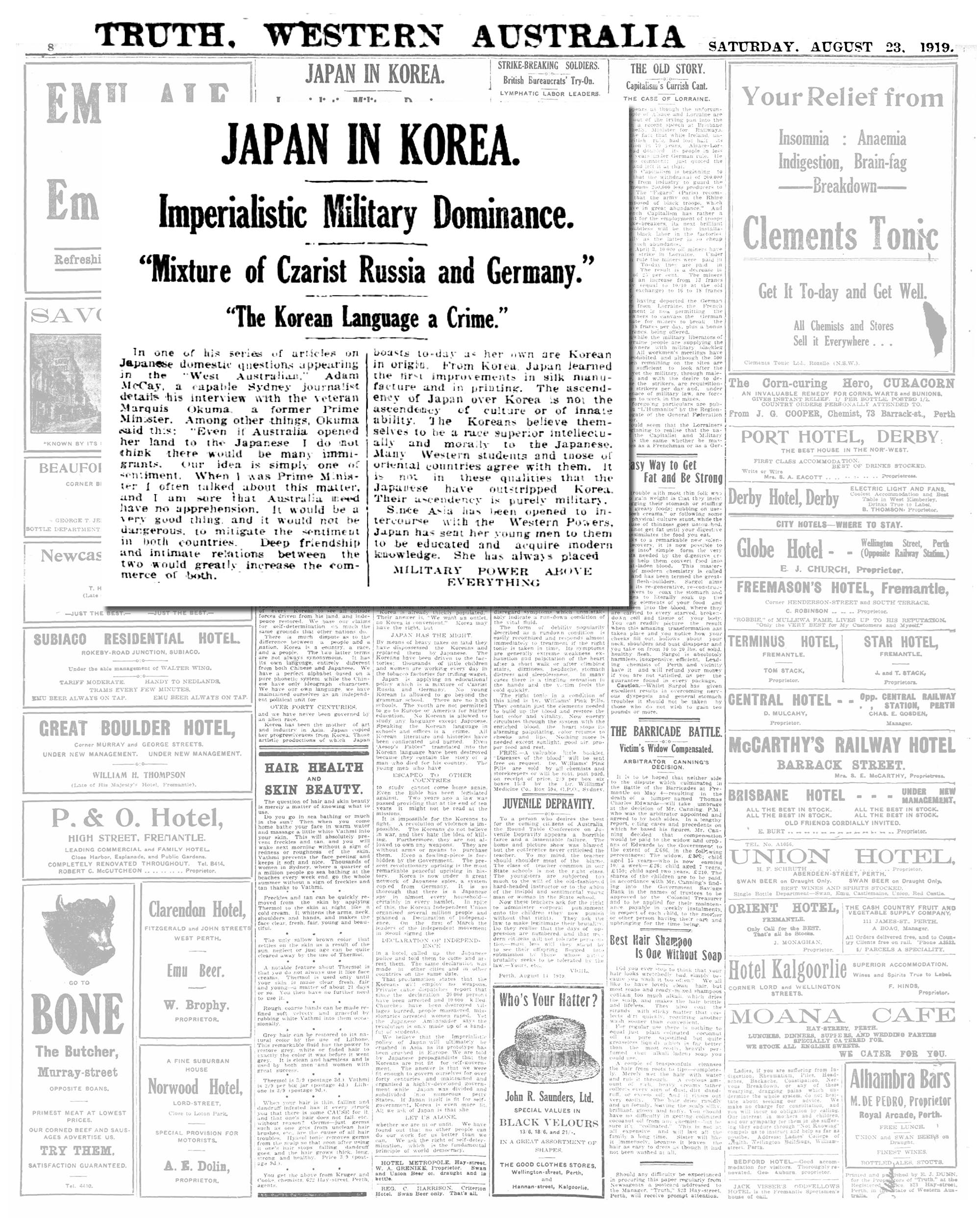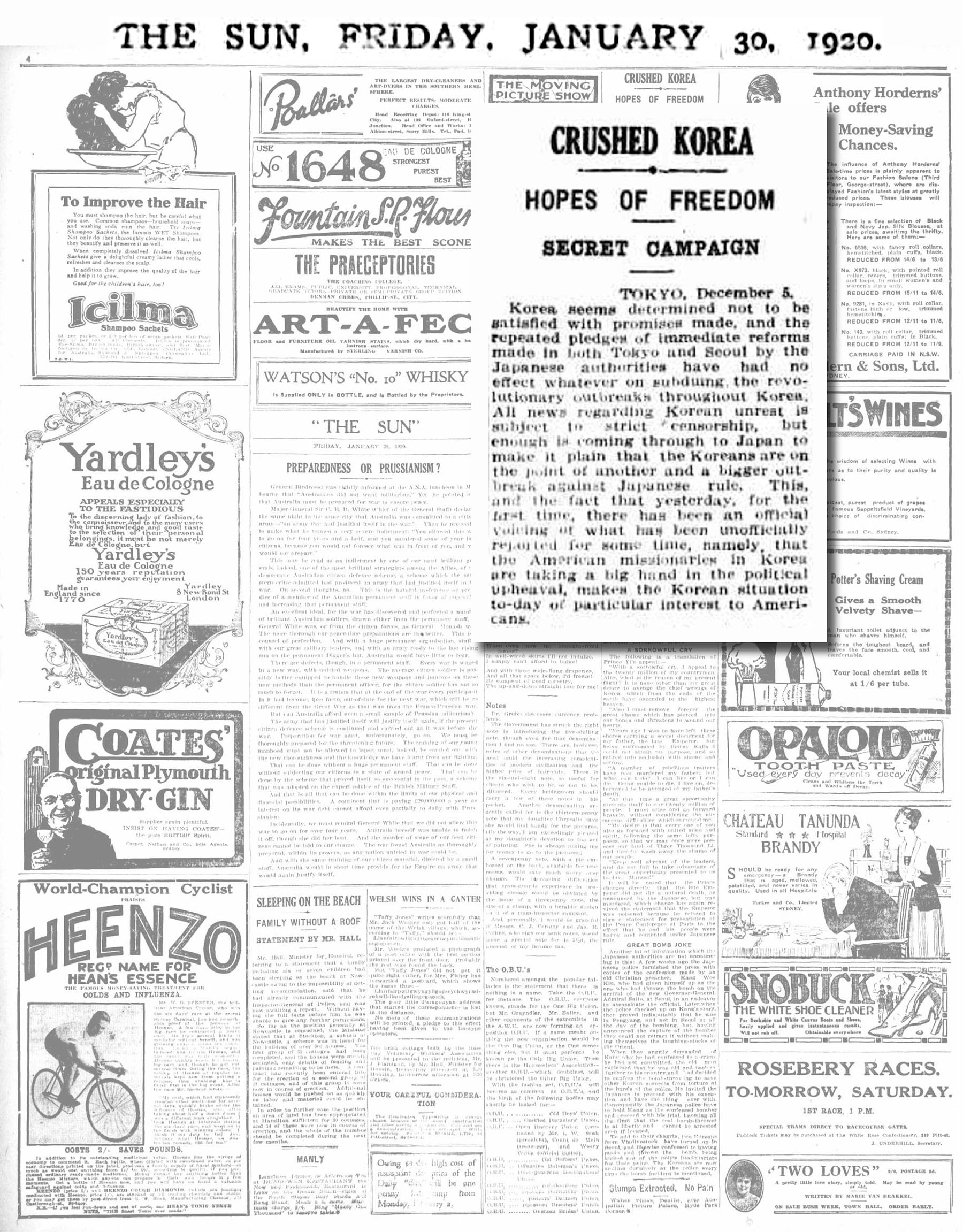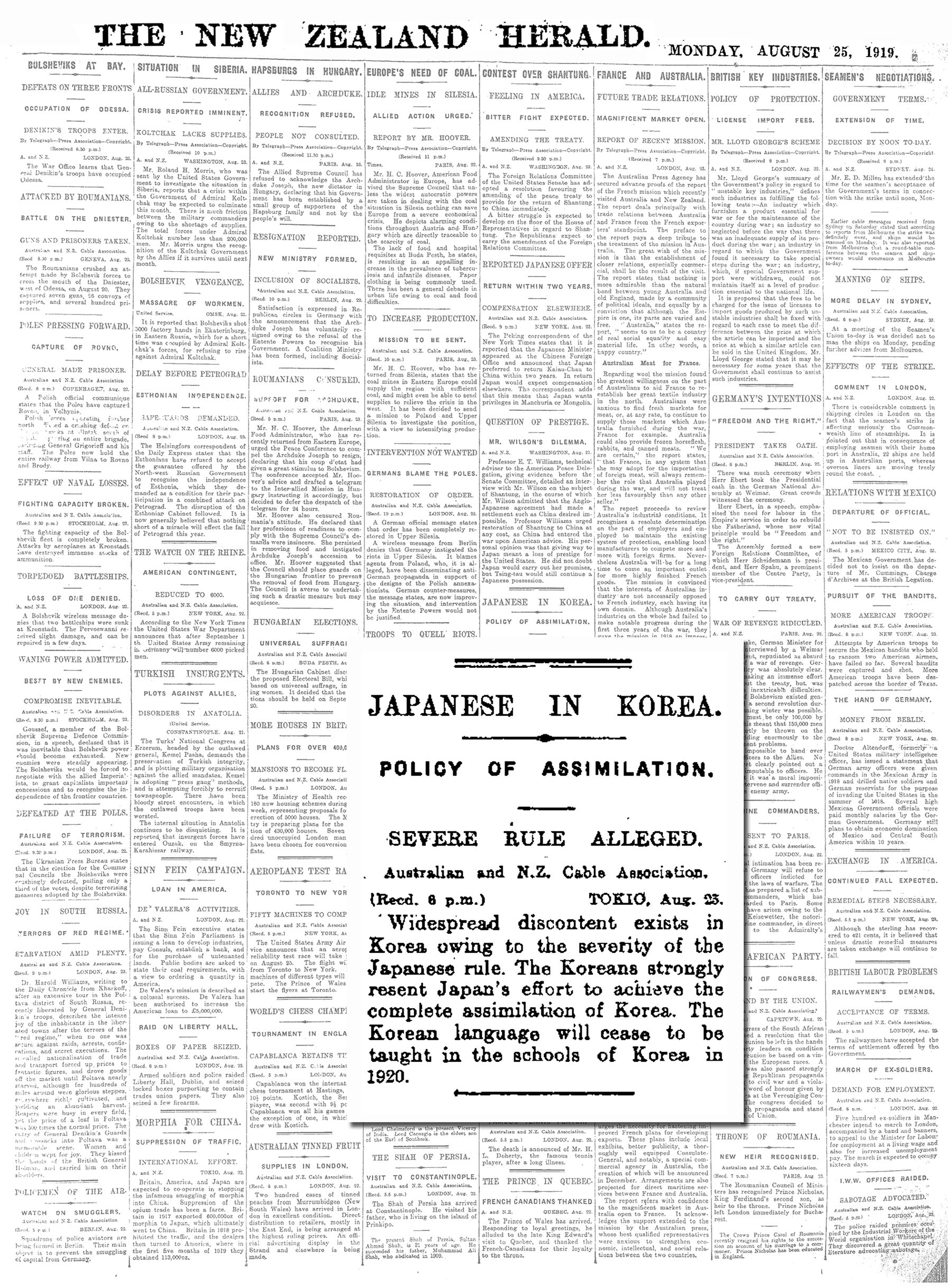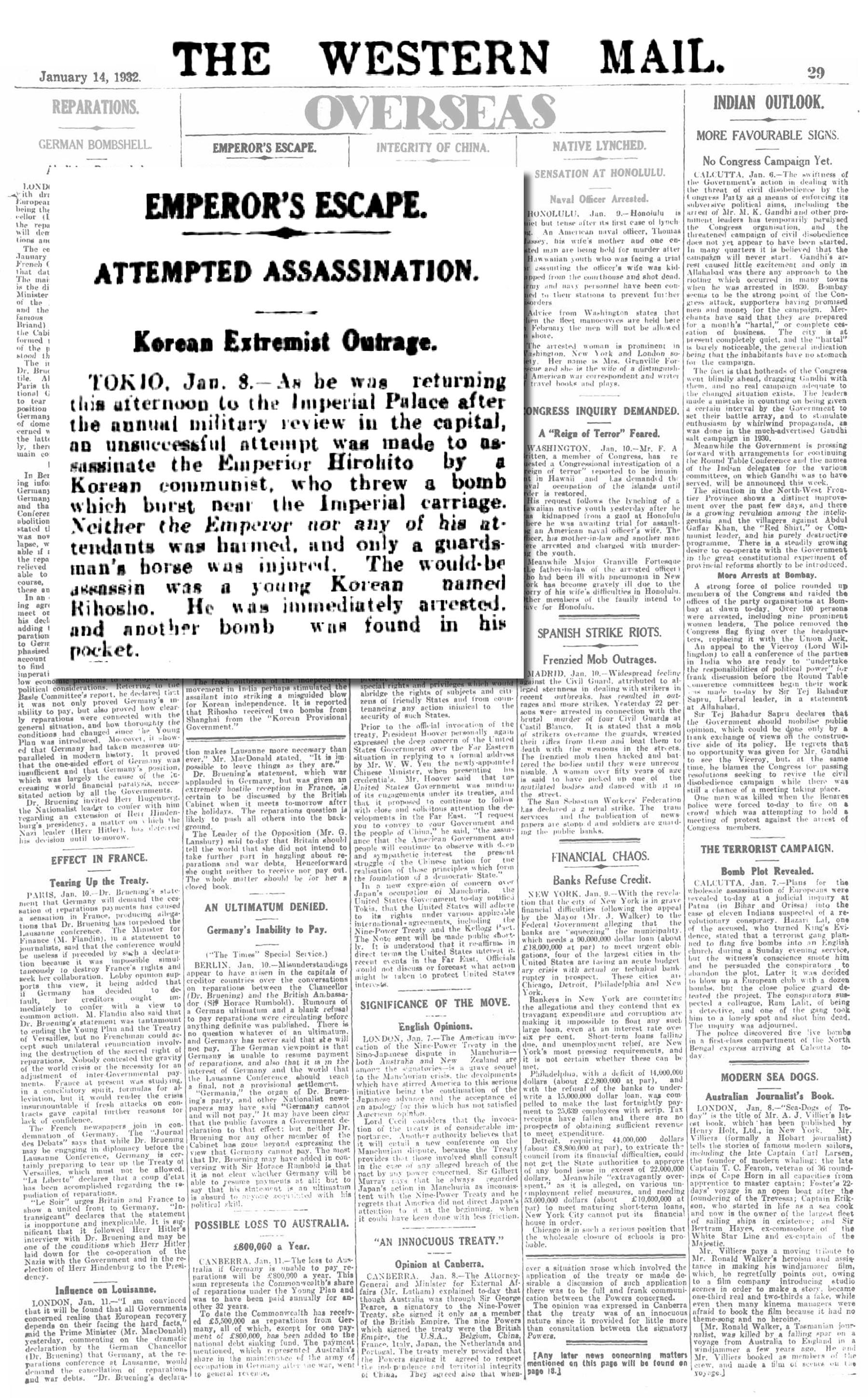1.서론
호주는 다문화주의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한인들은 1970년대에 처음 호주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상당히 중요한 소수자 공동체로 확립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궤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통합은 호주와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의 에스닉 연구에 있어서 다시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가 되었다. 다양성이 호주와 같은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본질적인 특성으로 장려되는 반면에, 얼마나 다양한 에스닉 집단들이 자신의 국가적인 정체성으로서 ‘호주인임’을 표방하는가는 중요한 질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인 이주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특히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호주로의 한인 이민 역사를 재검토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호주 사회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 패턴과 경제적 적응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들은, 다문화적 호주의 다양한 사회적 풍토에 정착하게 되면서, 젊은 세대가 한국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호주 내 대다수의 한인 이민자들은 New South Wales 주와 그리고 특히 Sydney 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정착하였다. 지난 국가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국 태생 74,538명 중, 41,819(56.1%)가 New South Wales에 살고 있었다 (ABS, 2011).
2.시드니로의 한국 이민 역사
1920년대에, 소수의 아이들이 호주에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온 호주 선교사들에게 입양된 아이들이었다. 1921년과 1941년 사이에 몇몇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호주로 오게 되었다 (ADIC, 2011: 1).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곽묘임 씨는 호주 군인과 결혼하여 1957년에 호주 시민권을 부여받은 첫 번째 한국인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민 규제가 약간 완화된 이후에 상당수의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1969년에 도착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1971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태생의 사람들은 468명에 불과했다(ADIC, 2011: 1).
대략적으로, 197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한국으로부터 호주로의 이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의 ‘사면’, 가족상봉 이민,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숙련되고 독립적인 이민,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의 사업 이민이 있다.
본국의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의 주요 단계들과 한인들을 해외로 송출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을 떠나는 시기와 그들 각각의 사회 경제적 특성들에 반영되어 있다.
호주 정부가 이민자들의 수용을 그들의 구체적인 자격과 요구조건들에 따라 달리하는 것 역시 호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의 다른 단계들에 상응한다.
1960년대에 한국인들 중 자본을 소유했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없었던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차후에 아메리카의 북부로 이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미로 향하였다.
물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였다(Kim, 1981). 자원과 직업이 없었던 한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전쟁 중인 베트남이나 서독으로 떠났다.
1960년대에 한국의 높은 실업률과 1962년에 정부의 이민정책은 농촌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도시 빈민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부추겼다.
해외 취업은 특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일정 기간의 직업 훈련 기간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하곤 하였다(Han, 2000b; 2003; Yoon, 1993).
약 25,000명의 군인들과 민간 노동자들이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국인, 영국인, 그리고 호주인과 연합하여 일을 수행하기 위해 남베트남으로 떠났으며(Kim, 1981: 54; Vogel, 1991: 62),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한 자본을 획득하도록 하였다(Cole and Lyman, 1971: 135).
미국인과 한국인은 1973년에 남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1975년 4월의 전쟁 바로 직전과 직후에 몇몇의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500명의 한국 민간 노동자들은 진보적인 Whitlam 노동 정부 계획의 일환이었던 1개월짜리 ‘Easy Visas’를 통해 호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김형식, 2000b; Han, 2003: 40; 이재형, 2011).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뿐만 아니라 486명의 한국인들 역시 비자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으나 이후 1976년 1월에 Whitlam 정부에 의해 호주 내에서 합법적인 상태로 머무를 수 있도록 사면을 받았다(이재형, 2011: 143; 백시현, 1990: 24; 양명득, 2010: 120).
1976년의 사면이라는 좋은 소식은 중동, 서독, 그리고 우루과이와 브라질과 같은 남미 국가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전해졌다. 그 소식은 심지어 한국 내 미군 부대의 군사 기지인 동두천시에까지 전해졌는데, 이곳은 베트남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호주로 오게 되었다. 호주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에 비자 기간 초과 체류자들의 수는 2,500명에 달하였다(김정엽 and 원종인, 1991: 129에서 재인용).
1980년 6월에 있었던 두 번째 사면은 188명의 한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였다(백시현, 1990: 24). 그 이후 수년간, 한국인들, 주로 남성들은 호주의 이주민 가족 재회 계획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김방이, 1986: 21; 김정심, 1992: 431).
<표 4-1>

▲ <표 4-1>
한국에 있는 노동력 수출 중개 업체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첫 번째 집단을 꾸린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였다. 중개 업체는 John Meryers라는 영국 중개인과 협력하였는데, 그는 멕시코 농장으로 이주할 일본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일본 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현규환, 1976).
총 1,033명이었던 첫 번째 집단은 1905년 5월 15일에 멕시코, Salina Cruz의 항만에 도착하였다. 22개의 다른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꼈고 많은 이들이 무단이탈을 시도하였다(탁나현, 1987).
1960년대 초반에 브라질 정부는 자국 농장의 발전을 위해 농업 이주민을 찾고 있었다. 17개의 가구 내 91명의 사람들이 1962년 브라질에 도착하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멕시코 그리고 볼리비아와 같은 남미 국가로의 한국인 이주가 재개되는 시점이었다(Kim, 1981: 49; KDI, 1979: 37).
그러나 농부가 되기 위한 선별 기준과는 달리, 그들 중 절반은 농부가 아니었고 농사에 관심이 있는 것조차 아니었다. 이에 따라 농장에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브라질 내의 도시들이나 쿠바,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다른 목적지로 떠나갔다.
남미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리우 데 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에서 정착하였고 농업을 그만두었다(동아일보, 1974, Kim, 1981: 55에서 재인용; 현규환, 1976: 1036; KDI, 1979: 124).
이주와 해외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는 한국 학술지 『해외 동포』(1992)에 의하면, 잠재적 한국 이주민에게 멕시코가 매력적인 목적지가 된 이유는 미국으로 입국하기에 좋은 전환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또한 호주로 입국하기에 좋은 전환지점이기도 하였다. 남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호주에서 사면을 받은 이들에 대해 전해 듣고 호주로 이주해 왔다(Coughlan, 1995: 384).
<표 4-2>

▲ <표 4-2>
1972년에서 1978년까지 대략 50,000명의 한국인들이 중동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New York Times, 1978). Kim(1981)은 100,000명 이상의 많은 한국인들이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97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만 68개의 한국 건설 기업과 93,000명의 한국인들이 진출하였다(Vogel, 1991: 62). 중동지역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많은 이들이 미국(문광환, 1989: 32)이나 호주와 같은 다른 목적지로 이주하였다.
동아연감(Kim, 1981: 5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1963년과 1974년 사이에 약 17,000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가 서독에서 일했다고 한다. 한국 광부들은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 온 광부들에 비해 높은 수치의 사상자를 기록했다(현규환, 1976: 1050).
서독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 중 20%는 자격이 있는 간호사로 고용되었고, 80%는 간호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중에 대부분은 간호사로 등록되는 자격을 충족하였다(현규환, 1976). 1970년대 후반의 경제 침체 기간 동안, 서독은 이주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함께 숙련 간호 이주민으로서 미국에 입국하였고(Kim, 1981: 54), 다른 이들은 캐나다로 떠났으며(현규환, 1976; 엄인호, 1987: 45), 약 20-30개 가구가 호주로 떠났다(김만석, 1988).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계약을 맺은 한국인들 중에서 몇 천 명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관광 비자를 통해 호주로 입국하여 그 이후에 사면으로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적은 수의 숙련/독립 이주민들만이 호주 내 한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 베트남, 중동, 남미, 그리고 서독에서 온 한국인들이 호주 한인 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Han, 2003: 46).
서독에서 온 이들은 유일하게 호주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민 신청을 제출하고 그들의 기술이나 간호직 자격 조건에 의해서 숙련 이주민으로 호주에 입국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나중에 1970년대에 이르러 영주권자로 정착하게 된 한국인 집단은 동두천시에서 온 80가구였다.
그들은 이전에 동료였던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호주에 이주해 왔다(Han, 2003: 46). 1970년대에 이주해온 거의 대부분의 초기 이주민들은 시드니 지역에 정착하였다.
1976년도와 1980년도 사면은 호주의 성장하는 경제에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전은 1973년 소위 말하는 백호주의 정책의 공식적인 폐지 이후로 진행되었다.
건강한 신체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두 차례의 사면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79년에 호주 정부는 다면적 수치 평가를 시행했는데, 이는 잠재적 이주자들이 이수 교육, 영어 구사 능력, 연령 기준에 반하는지 그리고 호주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평가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 계획 하에서, 숙련/독립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가 1980년부터 이루어졌다.
사면 이주자들과는 달리 숙련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비교적 더 잘 교육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했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비즈니스 이주민’이라는 범주는 고용을 창출하고 호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비즈니스 이주민들은 건강하고 숙련된 사람일 것으로 기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7년과 1993년 사이에 3,490명의 한국인이 비즈니스 이주민 범주로 호주에 입국하였다(김영성, 1998: 51).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는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좋은 경제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해외 교육과 해외여행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호주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이민 목적지 중 하나였다. 2002/3년에는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이 11,270명이었고, 2003/4에는 14,735명, 그리고 2009년에는 35,708명이었다.
마지막 수치는 세 번째로 높은 숫자였는데, 중국인 학생이 첫 번째 그리고 인도인 학생이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많은 수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12개월 혹은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에 있는 한인 공동체 내 활발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였다.
3.정착 패턴
소수의 전문가들과 단기 직업 훈련생이 시드니에서 성장하는 한인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드니 내에서 한국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이 1970년대 중반까지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김영성, 1998: 42, 46). 논의한 것처럼, 호주에서 한인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1976년과 1980년의 사면을 통해서였다.
1976년에는 1,460명의 한국인이 그리고 1981년에는 4,514명의 한국인이 있었다(양명득, 2010: 121). 이에 따라 1980년 즈음에 한인 공동체의 형성이 분명해졌다.
<표 4-3>

▲ <표 4-3>
해당 년도 기준으로 호주에서의 한국인(한국 태생) 수
·출처: ADIC, 2011; Coughlan, 2008.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거의 모든 한국인이 시드니를 통해 호주로 입국한 듯했고 이들의 대부분이 시드니에 정착하였다. 1973년 기준으로 그들 중 73.4%가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었다. 1977년에는 66.7%, 1979년에는 65.9%, 1984년에는 79.0%, 그리고 1991년에는 73.5%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호주에 사는 한국 태생의 사람들이 74,538명이었고 그중 53.9% 혹은 40,175명은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ABS, 2011).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비율이 이처럼 상당히 감소한 것은 New South Wales 이외의 다른 주로 새로운 이주자들을 분산시키고자 한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시드니에 사는 한국인은 호주의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시드니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1년 ABS 통계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수가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했다(이경숙, 2008: 174).
김영성(1998: 45-6)은 왜 한국인이 시드니 지역에 집중되어 살게 되었는지에 관한 몇 가지의 원인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도시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은 호주에서 가장 대도시인 시드니에서 규모의 경제와 더 나은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드니 지역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한국인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연쇄 이주 현상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많은 수의 한국인으로 인해 존재했던 식당과 같은 에스닉 사업들 그리고 현지 에스닉/언어에 기반한 관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네 번째로, 시드니와 서울 간의 직항이 도입되어 두 도시 간의 항공 여정이 용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시드니에는 많은 한인 사회 네트워크와 우수한 교육 기관이 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공간적 정착은 그들이 호주로 이주해왔을 때 지녔던 그들의 사회 경제적 특징을 반영했다. 사면 이주민들은 Redfern과 같이 낮은 사회경제적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점차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에 따라 도심지역으로부터 옮겨 가고자 했다.
중요한 점은 잠재적 한국인 이민자들이 이민 이전에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괴리감’의 지속은 시드니에서의 공간적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직장에 다닐 뿐만 아니라 시드니 대학교나 시드니 공과대학교, 혹은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던 소수의 학생들은 Glebe와 같은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는 직장으로의 출퇴근과 학업을 위한 선택이었다.
소수의 학생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새로운 한국인들을 시드니 공항에서 맞이해 주었고 새로 온 이들은 Glebe와 근처의 Redfern에 정착하게 되었다.
사실, ‘260 Charlmers Street, Redfern’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다가 1973년에 관광객으로서 호주에 입국한 김동삼의 유명한 거주지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취업 기회, 아파트 구하기, 영주권 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통해 입국하였다(이경숙, 2008: 175).
Redfern 주변에 초기 한국 이주자들의 잠재적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곳으로는 봉제 공장, 신발 제조 공장, 그리고 타이어 공장이 있었다.〠 <계속>
한길수|멜번 모나쉬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교수
------------
시드니 내 한인 공동체(2)
정착, 경제적 적응,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흥
한길수/크리스찬리뷰 시드니 내 중심 상업 지역이나 산업 공장들과 가깝거나 혹은 철도역 근처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으로는 Surry Hills, Redfern, Darling-hurst, Marrickville, Summer Hills 그리고 Newtown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의 임대료는 비교적 지불 가능한 수준이었다(김영성, 1998: 46-47).
1976년과 1980년의 사면 이후에, 사면 받은 한국인은 그들의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들은 임대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과 상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찾아 다녔다. 자녀들의 교육은 거주지의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많은 한인들이 Campsie, Ashfield 그리고 Canterbury에 정착하기 시작하자 더 많은 한인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는 원심 주거 이동성에 관한 실례의 시초였다(김영성, 1998: 47-48).
1986년에 Canterbury시에는 Campsie, Belmore, Canterbury 그리고 Lakemba를 아울러 1,000명이 조금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새로이 이주해온 한인들은 이미 정착한 친척이나 새로운 지인들 근처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였다. 2001년의 경우, Canterbury에 사는 한인들의 수는 3,131명에 도달했고, 이 지역은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에서 한인 이주민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되었다(이경숙, 2008: 176).
그러나 2006년에는 2,998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Canterbury는 네 번째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감소의 일부는 호주에 사는 한국인 중 적은 비율이 시드니 지역에 사는 것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Canterbury에 초기에 정착했던 이들이 노령으로 인해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점차 더 적은 한인들이 Canterbury에 거주하고자 하면서, Canterbury 지역은 신생아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덧붙여, 젊은이들이 Canterbury 지역을 떠나 Strathfield, Eastwood 그리고 Chatswood와 같은 지역으로 새로이 옮겨가면서 Canterbury는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상업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
2006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Hornsby(3,271명)가 한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뒤로 Parramatta, Ryde, Strathfield, Sydney, Auburn, Baulkham Hills의 순서로 뒤이었다. 지역 내 쇼핑센터 주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들 또한 한인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는데 한 몫을 했다(이경숙, 2008: 178).
북 시드니의 한국인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Auckland에 살던 많은 한국인 이주자들이 Hornsby, Carlingford, Eastwood 그리고 Deewhy 같은 시드니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 교통 접근성이 좋고 자녀들을 위해 평판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장소를 찾아 다녔다(김지환, 2008c: 107).
Parramatta가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평판이 좋은 학교,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쉬운 접근 때문이다. Parramatta에서 시드니 중앙역까지는 기차로 40분, 급행으로 20-25분이 소요된다.
Ryde는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또 하나의 지역인데, 특히 학생들과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게 유독 인기가 많았다. 2001년에는 2,018명의 한국인이, 2006년에는 3,028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기차와 버스를 통해 도시와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파트의 많은 공급으로 인해 시드니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은 Eastwood와 가까웠는데, 여기에는 꽤 규모가 크고 이미 자리를 잡은 한인 소유의 사업체들이 있었다(이경숙, 2008). 2006년 당시에 시드니 시내의 인기와 비슷한 정도로, 2011년 Ryde에 사는 한국인들은 3,035명에 달하였다.

▲ © 한길수
이경숙은 이러한 인기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나타났다고 제시한다.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도시 중심이나 자신이 다니는 전문대학교 근처에 거주한다.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자가 되면, 그들은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지내던 곳에서 계속 머무른다.
나아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유자, 관광객, 그리고 여타 단기 방문자들 또한 시드니 시내에 머무르고자 한다. 인구조사가 8월 9일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한국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자 온 학생들의 수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원심 주거 이동의 일환으로, Willoughby, Baulkham Hill, Strathfield 그리고 Canada Bay와 같이 상대적으로 풍요한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정착하는 한국인이 증가하였다. 이는 1.5세와 2세대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hatswood를 아우르는 Willoughby 지역은 특히나 한인 사업 대표, 어린 자녀를 둔 ‘기러기 엄마’, 그리고 최근에 이주해온 젊은 숙련 이민자들 가정에게 인기가 많았다(이경숙, 2008: 178-9).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사는 305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지리 조사를 수행한 김영성은 한인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모을수록 더 좋은 거주 환경으로 옮겨가고자함을 발견하였다. 좀 더 비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덜 비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비율은 1: 0.83이었다.
더 좋은 생활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은 현재의 거주 지역보다 주택가격의 중간 값이 더 높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43.3%가 더 비싼 지역으로 옮겨갔고, 27.8%가 비슷한 가격의 지역으로, 그리고 39.8%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갔다(김영성, 2006: 509).
요약하자면, 1세대 이민자들, 즉 사면, 숙련/독립 그리고 비즈니스 이민자들은 원심 거주 이동성에 상대적으로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1.5세대와 2세대들은 사회적 상향 이동을 성취했고 그들의 부모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생활환경으로 이동하였다.
덧붙여, 최근에 이주해 온 한인 이민자들, 단기 학생 그리고 단기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자본을 가져왔기 때문이거나 혹은 호주로 이민을 오기 이전에 그곳에서 학생으로서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1세대가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한국인 공동체 내에서 한국인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거리감’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사면 이주자와 같은 ‘구포(구교포)’와 숙련/독립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민 등과 같은 ‘신포(신교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은 서로를 향해 비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한인 공동체에서 광범위한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반영하고는 했다(Han, 2001: 547).
4.아시아 금융 위기와‘IMF 방랑자’
호주는 80년대와 90년대 동안 점차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호주 정부는 국제 시장의 맥락에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의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호주 국내 경제는 199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강타했던 아시아 금융 위기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자국 내 경제적 역경은 시드니 내 한인 공동체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Seol, 1999).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통화가치의 붕괴 이후에 한국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도입했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과정을 ‘IMF(개입) 위기’라고 부른다(Han and Han, 2010).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시드니에 있던 한인 공동체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드니로 오는 관광객의 유입이 멈추었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유자와 ‘정상적인’ 방문자들이 1997년 이후에 상당히 줄어들었다.
대신에 한인 공동체는 한국에서 새로운 실직자 혹은 파산자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시민들로 이루어진 임시 이주자들의 강한 존재감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시드니의 한인 이주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임시 이주민들을 ‘IMF 방랑자’라고 이름을 붙였다(Han and Han, 2010: 28).
호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그 숫자가 회복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이 같은 감소는 한인 공동체의 사업 활동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동체 내에서 비슷한 사업장들 사이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인 공동체 내에는 많은 사업들의 폐업과 임금 수준의 하락이 관찰되었다.
기존 주민들과 임시 이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Han and Han, 2010: 28). 지금까지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수인 4,255명이 영주권자로 호주에 정착한 것은 2006-7년 회계 연도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구 정착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9-10년도에는 4,350명, 20100-11년에는 4,326명, 2011-12년에는 4,874명, 그리고 2012-13년에는 5,258명이었다. 반면에, 한국 사회가 점차 풍요로워지면서 최근 몇 년간 해외에 있는 한인들의 귀환 이주를 상당히 촉진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1년에는 그 수가 4,257명에 달하였다. 2,122명은 미국으로부터 귀환했고, 693명은 캐나다, 629명은 중앙 그리고 남부 아메리카, 115명은 뉴질랜드로부터, 67명은 호주로부터 그리고 631명은 여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귀환하였다.
5.경제적 적응
1) 사면 이주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이주민들 또한 이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격 조건들을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종종 이주민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자격 조건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자격 조건과 상응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다(Castles and Miller, 1993: 109). 한국 남성들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 종사했던 유형의 직업은 호주에 입국한 방식 그리고 호주에 입국한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호주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1970년대에 도착한 후 사면된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 작업, 용접, 세차, 식기 세척, 청소, 트럭 운전, 배달 및 광업과 같은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다.
필자의 다른 연구(Han and Chesters, 2001)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에 따르면 한인 사면 이주자들은 배터리 생산, 타이어 제조, 철 정제 및 플라스틱 용기 생산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모든 사면 이주자들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가능한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었다(Han, 1999b: 11).
마취 기술, 법학 학위, 그리고 전기 공학 기술 등과 같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한인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훈련을 호주에서의 직업에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Iredale, 1988). ‘곧 사면을 받고자 하는 이주자’들이 호주에 ‘관광객’으로 도착하자마자 호주 기업들은 이들을 ‘낚아채’듯이 고용했다.
사면 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상대적으로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그들이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집중되었다. 번영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1970년대에 한인들은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전직하였다. 인기가 많은 직종은 장시간 동안 일할 수 있거나 두 개 이상의 상근직을 가질 수 있었던 용접, 청소 그리고 여타 공사 관련 직업이었다. 용접공들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때 기업들은 잠재적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배우도록 돈을 지불했다(Han, 1999b: 12).
많은 한국인들은 때로 용접을 위해 함께 이동하기도 했다. Newcastle에 있는 캐나다 정제 회사는 한 때 70명의 한인 용접공들을 고용하였고, B.H.P. [Broken Hill Proprietary, Ltd.]는 180명의 한인 용접공들을 고용하였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했고 매주 일요일에는 쉬었다. (심무호, Paraguay에서 온 사면 이주자)
1970년대 한인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탈리아인과 독일인과 같은 비 영국인 이민자들은 보통 ‘더럽고, 어렵고, 굴욕적인’ 직업을 가졌다. 1970년대 이후, 그러한 일자리는 한인들에게 ‘이양’ 되었으며, 이는 에스닉 집단과 그들이 도착한 시기에 따른 노동 시장에서의 분업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사면 이주자들과 동두천에서 온 사람들은 호주에 도착했을 당시 40대였다. 그들은 청소나 기타 육체 노동을 통해 임금노동자로서의 일을 시작하여 작은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후에는 청소사업 계약을 따내어 소 자본가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하자 더 많은 청소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재투자하였다. 한인 청소부들이 청소업계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이들은 청소 ‘권리’를 획득했다. 새롭게 획득한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롭게 이주해온 한인들이나 청소 산업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 준비가 되었다.
전문직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장시간 근무하여 고소득을 버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인들은 호주인 평균 소득의 두 배 이상을 벌기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용접공이나 목수 등과 같은 노동자 혹은 반숙련 노동자로 남아있었으나 또 다른 상당수는 영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성취인 것으로 여겨졌다(이경숙, 2008: 188; Collins and Shin, 2012).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면 이주자들이 수년간의 노동 경험과 수년간 습득해온 기술을 지닌 채 호주에 입국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데(Han, 2000b), 이는 숙련 이주민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민과는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호주에서 일하는 초기 기간 동안 그들은 전반적으로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어느 정도 호주에서 사업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을 지니고 있었는데, 당시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기였다.
몇몇의 사면 이주자들은 한국 식료품 가게, 식당, 관광 대행사 그리고 건설 회사를 시작하였다. 건설 회사들은 종종 한인이 아닌 이들이 소유한 기업의 하청업체였다.
1970년대 말까지 시드니에는 한인이 소유한 사업이 20개 미만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는 등록된 한인 소유 사업이 250개로 증가했다(백시현, 1990: 25). 시드니에 있는 한인 소유 사업들은 주로 한인들을 자신들의 주요 고객으로 다루어왔다.
Inglis와 Wu(1992: 207)는 취업 중인 이주민들의 대다수는 고용주라기보다는 피고용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한인 이주민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자영업자이다. Inglis와 Wu(1992: 207)에 따르면, ‘그들 중 몇몇은 의심할 여지없이 비즈니스 이주 프로그램의 초기에 이주해왔으나, 많은 다른 이들은 명백히 기타 진입 범주 하에 입국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자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Inglis와 Wu(1992: 207)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즈니스 이민으로 호주에 온 한인이 전체적으로 약 40명에 불과했던 1986년 인구 총 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기타 입국 범주’들은 사면 이주민에 해당할 것이다(Kim, 1995: 55).
작은 사업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했던 방식은 계(契)였다. 자조집단 회원들은 계주를 중심으로 모이고 회원들은 매달 일정 액수의 금액을 납부한다. 집단의 회원 한 명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모든 돈을 받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돈을 갚는다.
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뭉치’돈을 모으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계의 성공은 구성원들 간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면 이주자들과 같이 삶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기꺼이 서로를 신뢰하고자 하고 계에 참여하고자 했었을 것이다.
시드니의 한국인 공동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숙련 이주민의 이주, 가족 재회,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자들의 등장과 함께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호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은 식당, 식료품, 건강 식품 가게, 관광 대행사, 기념품점, 그리고 미용실이다(Han, 1999b: 14). 이경숙(2008: 180)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한국인 여행자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사업 종목이 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침체할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부진했다.
시드니에 있는 한인 공동체 내에서는 잘 알려진 사업가들의 성공담이 존재한다. 청소부로 시작한 사면 이주자 중의 하나는 한 때 600명의 사람들이 고용된 청소 업체를 운영했다. 또 다른 사면 이주자는 용접공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꽤 큰 철강 회사를 운영하였다.
또한 정병률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란에서 트레일러 운전수로 일을 하기 위해 이주하였다. 그는 1976년에 호주에 입국하였고 이민부처로부터 호주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1980년 사면 이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용접 기술을 배워 장시간을 일하면서 7년 동안 주당 1,000달러를 벌었다.
그는 시드니에서 2에이커의 땅을 샀고 용접 작업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한국산 야채를 심었다. 2년 만에 그는 16에이커의 땅을 매입하였고 더 다양한 한국 채소들을 기르기 위해 땅을 개발하였다.
그의 농장은 1992년에 32에이커에 달하였는데, NSW주에서 가장 큰 아시안 야채 생산 농장이었다. 그의 소득은 호주달러로 연간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이었다(김정심, 1992: 435).〠 <계속>
----
시드니 내 한인 공동체(3)
정착, 경제적 적응,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흥
한길수/크리스찬리뷰의심의 여지없이 정 씨의 근면한 노동과 신중한 전력이 기여 요인이 되었으나, 비교적으로 호황이었던 호주의 경제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담들은 물론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호주 전체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숙련 기술 이주민
독립이민과 숙련 기술이민을 통해 입국한 한인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혹은 호주로 이주하기 이전에 교육을 잘 받았으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호주에서 이들 중 대다수는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았고 호주 이주의 선발에 기준이 되었던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다.
한인 숙련 기술 이주자 중 10-20% 미만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Han, 1999b: 15).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Inglis와 Wu(1992: 207)는 자신들의 연구 시기에 한인 공동체 내에서 숙련 기술/독립 이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인을 제외한 여타 남성 이주자들이 전체 신규 이주민들보다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Inglis와 Wu(1992)는 또한 다른 에스닉 집단과 비교해봤을 때, 한인 남성과 여성들이 공장 기계공/노동자로 고용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필자는 이들 중 높은 비율이 숙련 기술/독립/가족 재회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Han, 1999a; Han and Han, 2010; Min, 1984).
필자는 숙련 기술 이주자의 노동 참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면 이주자들이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어 있던 반면에, 숙련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전문적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호주 이민 담당 공무원에 의해 ‘선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차별적 문화와 숙련/기술 이민자들의 높은 열망은 사면 이주자들보다 숙련 이주자들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Han, 1999b: 15).
더 나아가, 1980년대의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부족한 영어 능력은 직업을 찾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호주에서 인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Laurence, 1986; Inglis and Philps, 1995). Birrell과 Hawthorne(1997)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주해온 숙련 이주민들이 그 전에 이주해온 이주민들, 예컨대 사면 이주자들보다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데 덜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온 숙련 이주민의 대부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Han, 2000b: 94).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숙련 이주자들은 성인을 위한 영어 수업을 6개월 혹은 그 이상 수강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실용 영어를 습득하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었다(Han, 1999a). 사실상 숙련 이주자들이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다른 지원은 없다(Duivenvoorden, 1997). 적은 수의 숙련 이주자들만이 그들의 전문지식에 관련한 직업을 찾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영어 능력의 부족이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은 숙련된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성공의 정도가 다양하다. 혼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꺼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편이다.
반면 고립되어 있고 질문을 ‘잘 묻지 않는’ 사람들은 업무 수행 성과가 좋기 어렵고 그들은 한 조직에서 일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납득할 만하다(Han, 1999b: 16).
1990년대 초반에 이주해온 컴퓨터 기술 숙련 이주자 130명 중에서 약 30%가 90년대 중반에 컴퓨터 관련 전문직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청소와 같은 ‘단순’ 노동에 관여하고 있었고 적은 수는 배관 작업, 한국 식료품 가게, 한국 식당 등과 같은 영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Birrell과 Hawthorne(1997)의 연구 결과와 놀라울 만큼 차이가 났는데, 이들은 비영어권 출신 컴퓨터 전문가들이 중국이나 필리핀과 같이 불리한 송출국에서 이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후 곧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Han, 1999b: 18). 언어와 문화를 제외하고 한국 숙련 이주자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조직 내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으며 한국 이주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많은 수의 교사들이 호주로 이주해왔으나, 비영어권 출신의 교사들이 교직에서 일하는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호주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Inglis and Philps, 1995).
필자는 한인 숙련 이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한된 영어 실력이 작업 능력을 약화했다고 제시한 바 있다(Laurence, 1986). 이주자로서의 삶을 위해 소득을 벌어야한다는 압박감은 그들로 하여금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실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구식이 되고, 이는 그들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전문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는 한국에서 비교적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호주에서 전문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 이상의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숙련 이주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신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긴 근무 시간을 요하는 ‘단순’ 노동이나 영세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민 생활 초기에는 품위 있고 질 좋은 생활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Han, 2000b: 100-1).
시드니 한인 공동체의 두 명의 한인 저널리스트들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에, 한인 노동 인구의 50%가 육체노동, 청소, 건설현장 일용직, 혹은 상거래에 관여했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그러한 ‘단순 노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199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BIMPR, 1995: 22), ‘한국 출생 남성들은 육체노동자와 이와 관련된 노동자(24.9%), 그리고 상인(21.9%)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199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한국 출생 인구의 실업률은 12.7%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호주의 국가적 평균수치인 9.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Coughlan, 2008: 55). 1990년대의 인구 총 조사의 시점과 사면 이주자의 상당 부분이 영세사업 소유주, 무역업자 또는 은퇴자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통계 수치에는 상당수의 숙련 이주자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숙련 이주자들은 육체노동 혹은 영세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런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금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김용호(Kim, 1995)의 조사 역시 사면 이주자가 숙련 이주자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자에 비해 영세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비즈니스 이주자: 사업자에서 ‘스포츠 장기 휴가객’으로
시드니 한인회의 이배근 전 회장은 1995년까지 약 400명의 이주자들이 호주에 도착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말해준 바 있다(Han, 1996: 83). 이민 자문관, 필자의 연구 정보원,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민 응답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인 비즈니스 이주민의 10%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다른 10%가 사업을 운영하고 가족이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과 호주를 오갔으며, 30%가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50%가 골프나 낚시와 같은 스포츠를 하거나, 혹은 엄밀히 말하자면 무직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사업에 관여하지 못했던 일반적인 이유로는 영어 실력의 부족함,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높은 임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값싸고 훈련된 노동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호주에서의 사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정보 자원을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 1980년대 후반에 이주해온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약 35만 불을, 1990년대의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최소 65만 불을 기본 요건으로 구비하여야 했다(Han, 1996: 82).
따라서 사업 설립에 필요한 금액의 하한에 거의 가까운 금액을 가져온 이들에게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사업과 이민자 삶 전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동호회를 유지하곤 했었다. 사업 실패와 상당한 자본 손실에 대한 실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
한인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보통 50대 후반이거나 혹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돈 없이 외국에서 사는 것은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Han, 1999b: 24). 필자의 연구에 참여한 비즈니스 이주자 응답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서 ‘큰’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호주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의 자존감과 은행 잔고에 의존하는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 노동을 찾는 것을 가로막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은퇴’할 만하다고 생각했다(Han, 1999b: 24).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했거나 노동일과 같은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1989년 이후에 이주해 왔기보다 1987년이나 1988년에 이주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대개 연령대가 낮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즈니스 이주에 필요한 공식적 금액이 1987-88년에 35만 불에서 1989년과 그 이후에는 65만 불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7-88년에 이주해온 이들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장소에 빠르게 적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자본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좀 더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직장에서 정착하게 된 방식은 숙련 이주자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였다(Han, 1999b: 24).
몇몇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자본을 좀 남겨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었다(Han, 1999b: 26). 마지막으로 상당한 비율의 비즈니스 이주자들은 무직 상태였고 비즈니스 이주자만의 독점적인 협회를 통해 ‘호주는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소비하기 위한 장소’라는 생각을 고취시켰다. 이들은 주로 서로와 함께 골프를 치며 지내곤 한다.
4) 시드니에 있는 한인 공동체 내 영세 사업
한국인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인 사업 활동이 한인 공동체 내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인 공동체 내 사업 활동은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어왔다.
1970년대 말에는 한인 소유의 사업체가 20개 미만이었지만 1986년에는 250개로 증가하였다(백시현, 1990: 25). 그 수치는 1990년에는 400으로, 1997년에는 1,300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와 더불어 사업 종류도 1992년에는 62개에서 1997년에 101개로 증가하였다(이경숙, 2008: 180).
시드니 CBD, Parramatta, 그리고 Chatswood에 있는 한인 소유 사업체들은 한인 고객들뿐만 아니라 한인이 아닌 고객들 또한 확보하였다. 그러나 Campsie, Strathfield, 그리고 Eastwood에 있는 한인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들 간의 경쟁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세 지역들에서 보다 치열하다.
호주동아의 2004년 공동체 조사(이경숙, 2008: 18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 10개 종류는 식당(87), 미용실(56), 식료품 가게(55), 건강식품(51), 이주 대행사41), 의류(39), 약초(35), 해외유학 대행사(34), 회계사(34), 그리고 여행 대행사(31)였다. 이 중 몇몇의 사업체들은 한국인 여행객 혹은 한국에 있는 잠재적 이주민 혹은 학생들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경숙(2008)은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업종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며 이 같은 치열한 경쟁은 특히 공동체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ampsie지역에 있는 한인 소유의 사업체들은 베트남을 통해 이주한 사면 이민자들과 1970년대 중후반 이들과 결합하기 위해 이주한 가족들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Campsie 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수의 사업체들로 ‘코리아타운’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Strathfield와 Eastwood는 한인 소유의 사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Eastwood는 1984년부터 한인 소유 사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신발 수선 가게가 가장 처음 설립되었고, 그 이후 1987년에 식료품 가게가 들어섰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인 이주자들은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Eastwood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 당시에는 8개의 사립 코칭 스쿨이 있었다 (이경숙, 2008: 180). 한인 유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은 Strathfield에 있는 한인 사업체의 주 고객을 이룬다. 이들 고객들은 한국적 생활방식, 헤어스타일, 패션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미용실, 의류점, 식당 그리고 식료품 가게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한다.
또 중요했던 사업은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한국 TV 시리즈와 영화를 공급하던 곳이었다. Kings Cross와 Bondi Junction 또한 중요한 한인 사업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한인 소유의 Capital Hotel 개업 이래로 식당과 기념품점과 같은 사업들이 뒤따라 생겨났다. 영어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Bondi Junction에 있는 한인 소유 사업체의 주 고객을 이루었다.
2011년 ABS 조사에 따르면, 교외 지역에는 1,666명의 한국 태생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Chatswood에 있는 한인 사업들은 특히 숙련/비즈니스 이주자, 외교관, 한국 기업에 의해 파견된 노동자들을 유인하였다. 마지막으로 Parramatta는 최근 들어 한인 이주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거주 지역이 되었고 이 지역에서의 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있다(이경숙, 2008: 184-6).
6. 한국어, 한국 예술과 한국 문화의 보전
한국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한인 이민자가 자신의 에스닉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한인 공동체 내에서 모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내집단의 구성원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또한 나머지 호주 인구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이 외집단의 구성원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한인 이민자가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예술과 문화를 진흥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체로 시드니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홍보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1) 대학교 학과를 통한 방법, (2) 정부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토요일 한국어 학교를 통한 방법, (3)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방법, (4)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조직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5) Linfield 한국 학교 혹은 호주한국 학교와 같은 독립 학교를 통한 방법이다.
한글, 한국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한인 공동체 내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인 이민자들이 다음 세대에 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김인기, 2008b: 234). 김인기는 한국 정부 지원의 교육 센터가 한국어 교육과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드니에 있는 한국 영사관 내에 설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센터는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다. 한인 공동체 내에서의 이런 교육에 대한 노력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둔 한국 이민자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 노력에 대한 소개이다.
첫 번째로, 시드니 한인 학교는 176 Redfern Street, Redfern에서 1978년 11월 13일에 시작하였다. 개교식에 참석한 하객들로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 서울에서 온 두 명의 교회 목사, 그리고 시드니 한인 연합교회의 김상우 목사가 있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학교에 참석하였고 이후에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업 부담으로 인해 주말로 변경되었다.
시드니한인학교와 시드니 내 한인사회는 1979년 Sydney Town Hall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공동 주최하였다. 기념식은 ‘한국인의 밤’을 포함했는데 이중창, 독창, 춤, 그리고 시 낭송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Town Hall의 좌석들은 만석이었다. 시드니한인학교는 계속 성장하였고 가장 많은 학생 수는 120명에 달하였다.
학교는 84 Redfern Street, Redfern에 있는 더 넓은 부지로 옮겼고 1985년에는 또 다시 141 Lawson Street, Redfern에 있는 부지로 이동하였다. 후자는 박상규에 의해 기부되었는데 그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자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 부모들은 카풀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을 제공했고, 학교 운영비는 한국 정부와 학교 간부들이 부담했다(김인기, 2008b: 235).
시드니한인학교는 또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와 ‘한국의 민족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학교는 한인 이주민, 외교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임시 거주민의 자녀들이자 1.5 및 2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유일하게 적절한 장소였다.
그러나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학교의 역할 역시 줄어들었는데 결국 2004년 12월에 폐교하였다. 이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들만의 한글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한인 교회는 호주 내 한인 공동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Han, 1994).
두 번째로, Linfield ‘한국 학교’와 ‘호주 한국 학교’는 독립적 학교들이었다. 한인 이주민들과 대한 상공 회의소는 1993년 5월 1일에 Linfield 학교를 처음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Linfield 초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이후 1997년 4월에 Turramurra 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겼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보충 자료를 각 학년마다 사용한다. 이는 미래에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학교에서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교육 과정은 또한 한인 이민자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학습하게끔 만든다.
이들이 토요일 하루에 학습하는 분량은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 주일 동안 배우는 학습량의 수준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25명의 교사와 280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12살까지 13개의 다른 학년으로 이루어져있다. 학습 과목은 한국어, 수학, 사회, 한국사, 지리학, 음악 그리고 중국어였다.
그러나 신기현 박사(UNSW 한국어학과 교수)는 이 학교 교장으로서 교육 과정을 조정했고 임시 거주 학생들과 영주권 취득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구별하였다. 학생들의 과외 활동은 한국 문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춤, 음악 밴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포함한다. 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몇 년간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학부모 협의회는 학교 근처에 매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김인기, 2008b: 240).
1991년에 NSW 교육부가 한국어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중요한 외국어 중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호주 한국학교는 1992년 9월에 설립되었다. 시드니 한국 영사관, 한국 교육 센터, 그리고 시드니 한인 사회는 이 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학교는 본래 Belmore에서 개교하였고 현재는 Pennant Hills High School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핵심 목표는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국계 호주인’을 양산하는 것이다. 학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까지 다양하며, 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8개의 다른 분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의 교외활동도 존재하는데 창의적 글쓰기, 전통 스포츠, 한국 전통 노래 부르기, 그리고 전통 악기 연주 등이 있다(김인기, 2008b: 242).
세 번째로 Saturday School of Community Languages는 특히 중요한데 학생들(9학년에서 12학년)로 하여금 대학교 입학시험인 HSC(High School Certificate)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는 1992년에 HSC 과목 중 하나로 채택되었고 첫 코호트(cohort)가 한국어 시험을 1994년에 치렀으며 대학 공부를 1995년에 시작하였다.〠 <계속>
한길수|멜번 모나쉬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교수
----
시드니 내 한인 공동체(끝)
정착, 경제적 적응,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흥
한길수/크리스찬리뷰대학교 입학시험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선정한 것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드니 지역에서는 4개의 다른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Chatswood High School(12개 수업), Rand- wick North High (2개 수업), Dulwich High (5개 수업), & Grantham High (4개 수업) (김인기, 2008b: 242-3). NSW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을 포함시킨 이후,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한국어를 교육 과정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14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고등학교가 한국어를 가르쳤다. 몇몇의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호주 정부는 한국어를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와 함께 5대 아시아 언어 중 하나로 지명했다. 시드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
첫 번째로 한인 학교 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한인 학교’의 연합회이다. 이 연합회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드니 내 한국어 교육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학교의 연구 교과서와 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두 번째로, 시드니 한국 영사관과 교육 센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진흥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한국계가 아닌 한국어 교사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교육 센터는 또한 60여 명의 한국어 교사들과 함께 ‘Go Korea! 워크샵’을 일 년에 네 번씩 주최하기도 하였다(김인기, 2008b: 246-247).
문학, 시, 동양화, 그리고 봉산 탈춤과 같은 한국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1985년부터 민속 무용 학원을 운영해 온 송민선 선생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주민 축제와 에스닉 소수자 축제에 정기적으로 초대받아왔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50개의 춤 공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7년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낸 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3년에서 4년 동안 춤을 배우고 그만둔다고 아쉬워했다(송홍자, 2008a: 261).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한 다른 활동으로는 Maek(한국 연극 기업), 음악 밴드 그리고 필하모닉 합창단이 있다.
호주한인문화재단은 한국 스포츠, 문화를 홍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풀뿌리 조직이며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자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송홍자, 2008b: 566).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에 한국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사무실은 시드니에 있다.
7. 시드니 내 한국 에스닉 동호회 및 조직
시드니에는 한인들에게 개인적, 문화적,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많은 사회 및 공동체 조직이 있다. 우리는 많은 한인 동호회와 협회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에 있는 다른 조직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 에스닉 정체성을 계승하는데 깊이 연관되어 있다.
1) 호주한인복지협회
이 협회는 1979년에 한인 호주 이민자로서의 삶이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 한인 이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동료 한인들이 새로운 삶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어 능력의 부족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과 불리한 점을 경험하는 것을 몇몇의 한인 이주민이 목격하게 된 것은 1976년이었다. 이 협회는 동료 한인들의 그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 New South Wales 정부에 자선단체로 공식 등록한 이후로 협회는 1983년부터 한정된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 덕분에 당시에는 몇몇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2008년 이후로 협회는 Campsie, Eastwood, 그리고 Parramatta 교외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필요를 충족하였다(조양훈, 2008c: 445).
협회 설립 초창기에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는 새로이 이주해온 이들이 정부의 복지 지원과 여러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 공무원들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노년 부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경우에는 한인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서류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타 지원 분야로는 아파트 임대와 관련된 문제, 가정 폭력, 임금 체불, 노동 착취, 불공정 해고, 바람직한 지역 사회에의 정착, 아이들에게 알맞는 학교 찾기 등이 있었다. 가정 폭력 혹은 이혼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의 경우 전문적 지원과 상담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초창기에는 제공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 그러한 전문 서비스와 상담이 여성의 공간, 그리고 정신 심리 상담소라는 개별적인 조직을 통해 제공이 가능해졌고 협회와 협력하기 시작했다(조양훈, 2008c: 446).
새로이 이주해온 이들의 지속적인 정착으로 인해, 그들의 초기 정착 과정과 경제적 필요는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인 공동체 사회의 긴 역사로 인해 결혼 안에서의 갈등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우려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인간 관계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과 자원이 부재한 협회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공동체 안팎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조양훈, 2008c: 446). 2007년에, 협회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세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Campsie, Eastwood, Parramatta, Strathfield, 그리고 Chatswood, 이 다섯 교외 지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노년층 고객들을 위한 세 명의 직원과 협회의 일을 지원하는 여섯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였다(조양훈, 2008c: 447).
2)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호주 진출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동포사회에 대한 그들의 초기 공헌은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힘겨운 전장에서 이미 긴밀한 우정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상부상조’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삶의 원천이 되었다.
이 협회는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야외 파티를 주최하였고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드니 한국 영사관과 한국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구성원들의 이민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 협회는 1989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20주년을 캠시 오리온센타(Orion Centre, Campsie)에서 동료 한인 300명과 기념하면서 한인 공동체 내에서 이 협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협회의 멤버들은 한인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호주에서 한인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왔다(조양훈, 2008c: 458-9).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자문기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기간에 한국 안팎에 있는 한인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198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내 7,000여 명의 사람들과 해외에 있는 10,000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되었다. 자문회의를 설립할 당시에, 통일부는 자문회의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가 두 번째 책임 담당자였다.
자문회의는 한국 대통령과 통일부를 직접적으로 자문하였다. 자문회의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정권에 해외/국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자문회의는 또한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한인 에스닉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장려하기도 하였다(조양훈, 2008c: 459).
4)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s)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의 발전 덕분에 한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신장하기 위해서 여성 가족부를 1988년 2월 28일에 설립하였다. 첫 번째 장관 한명숙은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 여성의 능력을 기르고 발전시키기 위해 KOWIN을 설립하였다.
KOWIN은 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에스닉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한국 여성의 리더십을 기르고,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 공동체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매년 회담을 주최하였는데, 해외에 있는 한국 여성 100명과 한국에 있는 여성 250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2004년 1월에 KOWIN 호주 지부가 만들어졌고 80명의 등록된 구성원이 있다(조양훈, 2008c: 467).
5) 경제적 및 전문직 협회
다음은 경제적 및 전문직 협회의 범주에 해당하는 동호회와 조직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는 1982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호주 내 한인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효율적인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들을 교환하는 한인 사업가들의 모임이다.
‘World-OKTA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Sydney’는 한인 경제 네트워크 중 가장 큰 네트워크인데, 이는 세계 곳곳에 있는 해외 한인 무역인의 조화, 성공, 그리고 통합을 가능케 한 해외 한인 무역인들을 지원한다. World-OKTA는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의 지원 하에 1994년에 설립되었다. 2007년 이래로 51개국에 97개 협회 지부와 6000명의 회원들이 존재한다(김익균, 2008a: 470-3). 다른 비즈니스 및 경제 협회로는 “재호한인실업인연합회”와 “한호 경제인 연합회”가 있다.
‘호주한인과학기술협회’는 1993년 10월에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조직의 목표는 호주와 한국 간의 과학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협회는 젊은이들을 위한 과학 경진을 주최하여 호주 대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과 연구 기관을 방문하도록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협회가 국제적 IT 회담을 주최하였는데 15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10주년 기념을 축하하였다. 교민사회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 회의에는 14개국에서 온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북한에서 온 과학자 4명도 처음으로 호주로 초청했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에서 온 대표단과의 교류는 기억할만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북한 대표자였던 리원시(Rhee Won-Si)는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계승하는데 기여한 호주 한인 이민자들의 역할을 인정하였다(호주일보, 21 Nov 2003; 김익균, 2008: 482에서 재인용).
‘한인간호인협회’는 1988년에 119명의 회원들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 구성원들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협회는 한인 공동체 안팎의 공공 보건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호한의학협회’(KAOMA: Korean Australian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는 대학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이 있는 젊은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이며 2004년 1월에 설립되었다. 구성원들은 질병 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학적 경험을 넓히고 월간 모임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고전 저서들을 공부한다. 협회는 동료 한인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호주에서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김익균, 2008a: 485).
다른 전문직 조직들로는 ‘한인상담협회’(2006년 10월 설립), ‘한인호주변호사협회’(2003년 10월 설립), ‘한인 호주정보통신협회’(1997년 10월 설립), ‘한인인큐베이터신용조합’(1993년 11월 설립), ‘호주한인건설협회’(1999 10월 설립), ‘한인건설기술자협회’(1999년 10월 설립), ‘한인택시운전사협회’(1983년 11월 설립) 등이 있다 (김익균, 2008a: 486-94).
한국에서는 건장한 젊은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 다양한 역할로 복무하는 것은 한국 국경을 넘어서도 지속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재호재향군인협회’, ‘해병대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협회’, ‘한호 해군재향군인협회’, ‘한인기독교육군장교협회’, ‘예비역장교훈련단(ROTC) 협회’(조학수, 2008b: 495-507)가 있다.
여러 스포츠 관련 협회도 존재한다. 예컨대 ‘호주 내 한인올림픽위원회’, ‘한호태권도협회’, ‘재호주대한축구협회’, ‘한인배구협회’, ‘한인골프협회’, ‘한인시니어 골프협회’, ‘한인복싱협회’, ‘한인수영협회’, ‘한인테니스협회’ 등이 있다(조학수, 2008a: 508-28).
복지 단체들은 한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드니민족문화원’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문화의 홍보 및 계승과 동료 한인 이민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세대가 센터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 전통 학교, 탈춤 클럽, 무료 영어 학교를 운영하였다.
센터는 한인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자료실’과 같은 도서관을 세우고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주최하였다. 자료실은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미등록 한인 이주자들을 도와주었고 노동자 권리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인권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전망 역시 자료실의 관심 주제이다(강기호, 2008: 530).
‘소수민족선교원’은 방문자와 학생에게 단기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등대의 집’에서 설립되었다. 선교원은 양명득 목사의 지도하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영향력 있는 운동을 주도했고 이는 호주 매체를 통해 보고되었다. ‘여성의 공간’은 1993년 7월에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른 복지 단체들로는 ‘한인 돌봄 및 공유’(Korean Caring and Sharing), ‘중국호주서비스사회’(Chinese Australian Service Society) ‘한인여성복지회’,‘재호장애우모임’, ‘Life Line’, ‘여성문화센터’(City Women’s Cultural Centre), ‘Spring Institute of Cancer Aid’ 등이 있다(강기호, 2008).
다른 협회들로는 문화, 예술, 학술 등에 관심을 가진 고령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또한 한인들은 학교 동창회, 향우회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호주 한인 50년사 편찬 위원회, 2008).
많은 협회 중에서도 교회는 시드니에 사는 한인 이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주요 종교였으나, 불교는 호주 한인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다.
시드니 지역에서 발행된 한인 신문들과 잡지들을 분석해보면 한인 불교 사원은 한인 활동의 중심지가 아니며 스님 역시 사회 지도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8. 종교, 한인 이민자 그리고 호주 공동체로의 통합
호주에 처음 세워진 사원은 홍법사로 1986년에 설립되었고 시드니 지역에는 현재 4개의 절이 존재한다. 반면 첫 한인 교회는 1974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그 숫자가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약 300여 개에 달한다. 불교가 호주에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편이고 한국에서 불교는 승려들에 의해 제도적 확장을 크게 보이지 못한 반면 한국에서 개신교는 많은 수의 신학대학 졸업생들에 의해 빠르게 성장했다(Han, 1994: 104-5).
소수 이민자의 주변인적 지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시드니 내의 한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한인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려움, 영어 능력의 부족함, 사회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노력 등을 보상해주거나 해결하는 사회적 기관의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많은 수의 신학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그들 중 대부분이 호주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Han, 1994, 2004).
크리스찬리뷰(August 2014)는 시드니에서 발간되는 월간지인데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170개의 교회 목록을 기록하고 있다. 각 교회는 2명 이상의 신학대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수 백여 명의 교인들이 있다. 교회는 호주에 있는 한인들의 에스닉 활동들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왔는데, 한인들은 자신의 에스닉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식 생활방식을 편안하게 지속하도록 독려받고 있다.
교회 내에서의 조직 활동과 운영, 그리고 의사 결정권은 대개 이민자 1세대 남성 회원들에 의해 관리된다. 1.5 혹은 2세대 혹은 여성 회원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인 교회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제한적이다.
한국교회들이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종파 내에 있는 ‘비한인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한인 교회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조직 구조, 즉 일반적인 지도자의 선발, 그들의 교회에 대한 재정적 기여, 교회 조직체의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높은 열망과 관계되어 있다(Han, 2004: 119).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인들은 다른 한인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그들의 에스닉 문화를 실천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한국 문화를 계승하도록 장려한다.
한인에게서 나타나는 분절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예컨대 후손들로 하여금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던가에 대해 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Portes, 1993). 그러나 여성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문제이다.
한국 이민자들이 더 넓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더 넓고 세계적인 문화에 통합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다면 민족 정체성의 유지는 바람직하다. 만약 한인의 민족 정체성의 보존이 세계화의 보편주의에 반하는 방향에서 추구된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껏, 유럽계-호주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한인 교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교회의 암시적인 역할은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인과 결혼하는 것의 편안함과 미덕은 교회 소속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강화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한국 순혈통주의는 한인교회와 같은 디아스포라적 한인 종족 조직들 내에서 쉽게 또 무비판적으로 고취되는데 이는 모국과의 연계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교회가 종족 간 결혼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 남성 지도자들이 한국적 가치를 장려하고 한국적 종족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공간으로써 교회는 한인들 사이의 전통적인 결혼 관행을 옹호한다.
어떤 한인들은 자신들이 대학 시절이나 전문직 관계를 통해 구축한 관계를 통해서 종족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 모두가 한인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으며 다른 이들은 한인 정서와 잘 맞지 않는 ‘혼혈’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제결혼이 장려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cf. Kim, 2000a), 문화,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와,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사회 안으로 통합되고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유교 문화 가치는 한인의 정신에 깊게 배태되어 있으며 한인 교회에서도 실천된다. 교육 열풍, 특히 고등 교육에 대한 열의는 해외 한인 공동체에서 만연한 일이다. 서울의 명망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은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 남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 문화가 사회 역사적으로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에 한인은 힘과 권위라는 관점에서 매우 구조화되어 있는 위계질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공동체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한인 이민자만이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종사한다(Han, 2004: 120).
이러한 경향이 소통지향적인 한인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은 요소인 것은 아니며, 또한 한인들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혹은 다른 호주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점차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교육에 대한 열풍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필자는 교육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사회적 능력과 여타의 개인적 발전의 측면들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필자는 한인 이민자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모국의 문화를 재생산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이 양육되도록 충분히 조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써 한인 이민자가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문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오명을 남기고 많은 학교에서 한인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뇌물을 통해 교사들에게 청탁을 하기도 하였다. 사실, 한인 교회의 신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문화적 관습을 초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인들이 어떻게 유능한 일원이 될 수 있는지는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설날, 광복절, 추석, 제헌절, 개천절, 현충일과 같은 한국 축제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가 아닌 한인들도 이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그와 같은 행사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눈물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몇몇 구성원들은 한복을 입고 떡, 잡채, 불고기와 같은 한국 음식을 나눠먹기도 한다(Han, 2004: 121).
한인 이민자가 한국 민족성을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필자는 그 이유들에 대하여 동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한인 이민자들은 정착 사회에서 사회적 혹은 구조적 배제에 직면한다.
많은 연구들은 비영어권 국가 이민자들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Han, 1999b; 1999a; 2000c; 2000a; 2000b; 2002; Min, 1996a; Light and Rosenstein, 1996).
예컨대, 호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의사와 치과 의사는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네트워크에의 가입이나 멤버쉽 유지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높은 수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조계보다는 치과 또는 의료계 종사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한인이 전문직 활동에 있어 네트워크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장벽에 관한 것이다(Han, 2004: 121).
한인교회들은 한인 공동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인데 이는 높은 비율의 한인들이 교회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 교회들은 어떻게 한인 이민자들이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호주 공동체에 유능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목표는 평판 좋은 호주의 다문화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종족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며, 뿐만 아니라 한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와 신념에 대한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포용해야 하는 다른 가치들로는 관용, 평등, 정의, 공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Han. 2004: 121). 필자는 한인 공동체가 이러한 제안들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더 넓은 지역 사회에 ‘손을 뻗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 몰두하면서 내부적인 일에 초점을 둔다.
한인교회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한 모국의 교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인다(Han, Han, and Kim, 2009). 교회들 자신의 ‘잔이 넘쳐흐르기’ 전까지 그들은 더 넓은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9. 결론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한인 이민자들은, 특정한 자원, 노동, 기술 또는 투자가치를 지닌 이주 인구를 찾는 호주에 정착했다. 사면, 기술/독립 그리고 비즈니스 이주민은 그들이 지니고 온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호주에서의 삶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그들의 지리적 정착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인 필요와 경제적 관여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인 이주민이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착 패턴은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시드니의 한인 이민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잘 구축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이 다문화 호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타의 호주사람들과 얼마나 더 밀접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한인 이민자 교회는 그러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끝>
한길수|멜번 모나쉬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교수
 제16기에 이어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회장에 위촉된 이숙진
제16기에 이어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회장에 위촉된 이숙진